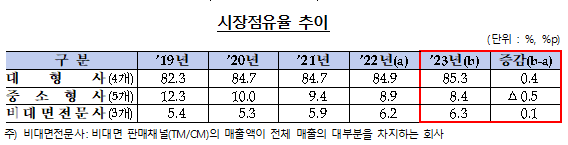‘소주 6000원’ 괴담에 나라가 들썩였다. 최근 1만5000원을 내야 ‘소맥’을 말아먹을 수 있다는, ‘마시던 술이 확 깨는’기사가 온갖 언론에서 쏟아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금이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 업계와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류업계 입장에서는 무시 못할 발언이다. 최근 금융권과 이동통신업계, 항공업계가 흠씬 두들겨 맞는 것을 봤다면 이번 정부의 기업을 대하는 기조를 체감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국세청은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기재부는 소줏값 인상 요인뿐 아니라 주류업체 수익 상황을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주류업체가 금융권처럼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단 이야기까지 들린다.
정부가 주류업계를 탈탈 털어봐야 소용 없는 일이다. 애초에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는 소주 가격을 올릴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소주 6000원 시대’는 어디서 튀어나왔을까. 관련 기사를 역순으로 검색해보면 대략 답이 나온다. 지난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인용한 기사가 이번 사태의 ‘원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가격은 전년 대비 5.7% 상승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11.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는 내용은 순식간에 ‘소주 6000원 시대’, ‘폭탄주 1만 5000원’ 등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기사로 재가공됐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무려 5년 전인 2018년에도 ‘소주 6000원’ 공포를 자극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온 시기가 있었다. 언론이 앞장서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제조사가 10원 단위로 가격을 올리면 음식점은 1000원 단위로 가격표를 바꾼다. 이는 현금으로 장사하던 시절, 거스름돈 주고 받기를 귀찮아 하는 관성 탓이다. 그런데 최근 식당 카운터에서 현금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모든 물건 값이 100원 단위, 심지어 10원 단위로 경쟁하는 시대다. 식당에서 파는 소주는 반드시 1000원 단위로 거래해야 한다는 이상한 ‘국룰’을 바꾸면 좋겠다. 스타벅스 커피값처럼 ‘소주 4800원’, ‘맥주 7200원’ 메뉴판이 등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도 생각을 바꿔야한다. 매번 제조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실태조사는 행정력 낭비다. 정부가 가격 결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한다.
전경우 기자 kw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