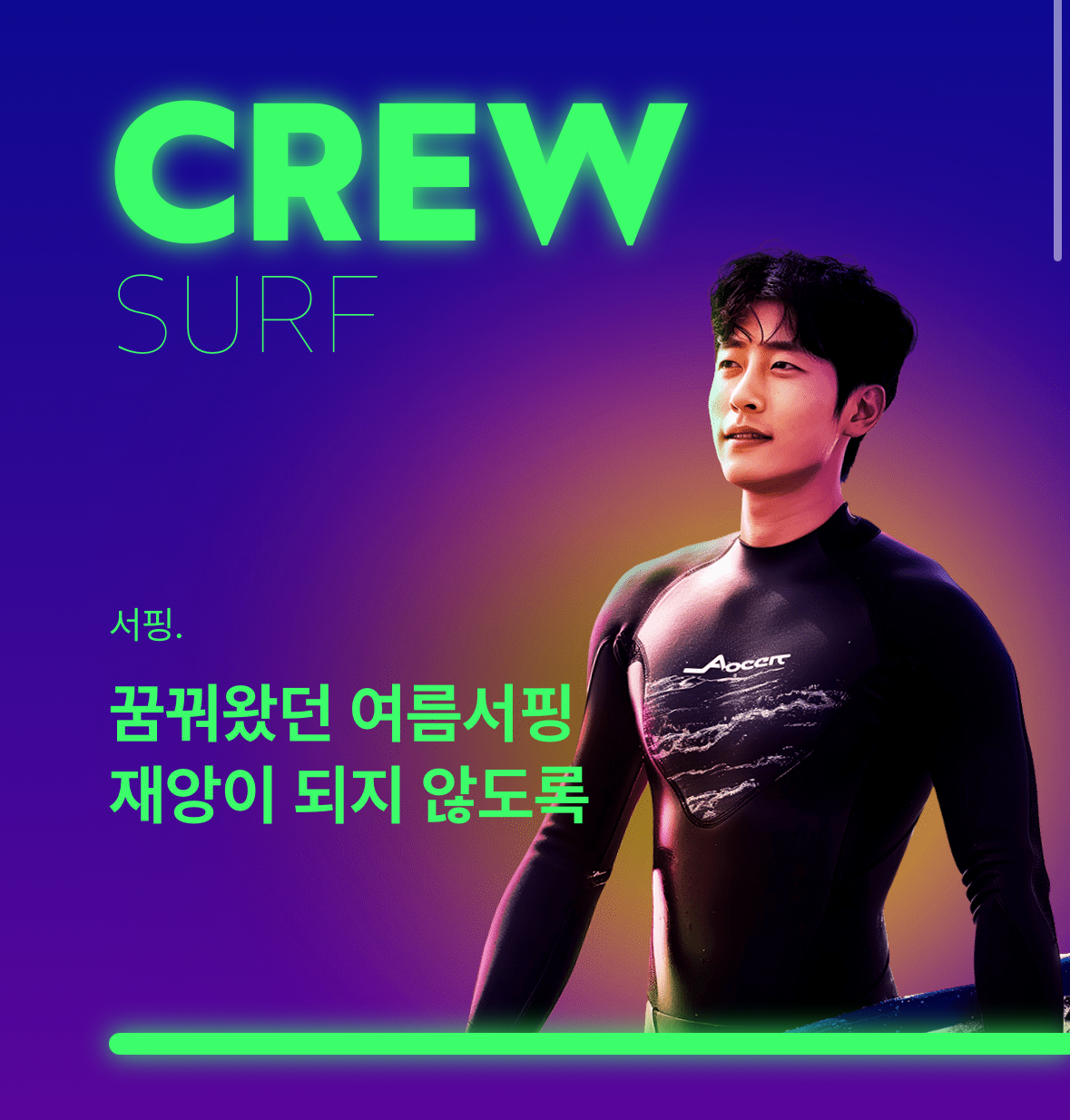“저희 동기들은 사실 캠퍼스 생활의 낭만이랄 게 특별히 없어요. 당장 졸업 후 취업이 걱정되니까요. 열심히 해도 뚫기 어려운 게 요즘 취업 시장인 것 같아요. 신입을 뽑는 면접에서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실 20대들의 반응이다. 사회초년생에 접어든 20대 청년들은 사춘기 시절 겪었던 혼란스럽고 막막한 시기를 다시 한번 겪는다. 차이점이 있다면 막연한 미래가 아닌 진짜 ‘현실 문제’로 인한 것이다.
우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 대학생 대다수가 대기업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하지만, 신규 채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어렵게 면접까지 가더라도 ‘MZ세대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면접관의 질문에 ‘또 탈락이구나’ 마음이 착잡해진다. 원하는 직장 조건을 말하면 ‘눈이 높다’는 타박을 듣고, 주변의 친구들과 비교하며 우울감에 빠지기도 한다.
고용절벽을 마주한 청년세대의 현실은 통계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대학 졸업장이 취업 보증을 해주던 시기도 이미 지난 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대졸 이상(4년제)의 비경제활동인구는 304만8000명으로, 중졸 비경제활동인구(316만명)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고학력자가 오히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청년 구직시장도 점점 축소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60.8%를 기록했다. 관련 조사 실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청년들을 향한 기성세대의 시선은 곱지 않다. 여전히 “의지가 부족하다”는 꼬리표에 시달린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하면 되지 않느냐’, ‘꼭 사무직이 아니라도 제조업, 건설 등 현장직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일삼기도 한다.
실제 통계청 및 OECD 자료에 따르면, 25~34세 연령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약 69.7~69.8%로,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 대학생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또래 대부분이 열심히 공부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노력에 비해 업무는 고되고 임금은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더라. ‘내가 열심히 한 게 있는데’ 하는 생각부터 드는 게 사실이다. 굳이 그런 직장을 택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취업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탈락의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해진다”고 털어놨다.
현실과 타협해 취업했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회사를 다니다 퇴사한 A씨는 “일단 생계를 꾸려야 하니까 작은 기업에 입사했다. 임금은 낮은데 업무 강도는 높다.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겪기도 한다”며 “일을 하다 번아웃돼 퇴사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다시 구직 의욕을 잃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실제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번아웃(소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2.2%에 달했다. 번아웃의 이유는 진로 불안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 과중 ▲일에 대한 회의감 ▲일과 삶의 불균형 순이었다.
고용이 불안정하니 청년층의 삶의 질도 떨어진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확대 공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20대 미혼율은 95.2%, 30대는 51.3%로 집계됐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31.3%)가 가장 컸다.
고용뿐 아니라 자산격차도 문제다. 통계에 따르면 20대 가구의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약 2.45배지만, 자산 격차는 무려 38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는 개인 노력보다 부모의 자산이 미래를 결정짓는 ‘계층 세습’ 구조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외 연구도 경고음을 내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상속 계급(inheritocracy)’이 형성될 경우 경제의 생산성과 혁신이 떨어지고, 노동동기를 저하시키며, 정치적 불만이 고조된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칼럼을 통해 사회적 기대와 현실의 괴리 속에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고용불안과 자산격차가 맞물리면서 청년들이 삶의 다음 단계를 설계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며 “사회가 그들에게 ‘왜 아직 일하지 않느냐’고 묻기 전에,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줬는가’를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