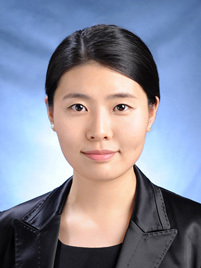[정희원 기자] 영등포 지역이 백화점 업계의 격전지로 부상 중이다. 지난해 2월 더현대서울이 여의도에 입점한 게 촉매제가 됐다.
당시 업계는 더현대서울의 영등포 상권 진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5㎞ 거리 이내에 신세계·롯데가 자리를 잡고 있는 데다가, 백화점 매출을 견인하는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

하지만 약 1년 뒤인 현재, 더현대서울은 단순한 백화점을 넘어 여의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부상했다. 매출 성적표도 좋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현대서울은 8개월 만에 매출 6637억원을 거뒀다.
특히 축구장 13개 크기(영업면적 8만9100㎡) 규모에 조경·휴식공간을 쾌적하게 조성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쾌적한 쇼핑을 즐기려는 고객 수요와 맞아떨어지며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영등포 지역에서의 승부에서도 더현대서울이 웃었다.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점은 5564억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3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더현대서울이 들어서기 전에도 신세계와 롯데는 1991년부터 경쟁하며 엎치락뒤치락 1위 자리를 겨뤘다. 이제는 새로운 경쟁자까지 등장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터줏대감들은 신흥 강자를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 서남권부터 인천·광명·부천·시흥까지 포용하는 영등포 상권을 놓칠 수 없어서다.

눈에 띄는 것은 신세계의 행보다. 신세계는 명품 강자답게 ‘명품 라인업 확장’ 카드를 꺼냈다. 올 상반기 ‘로에베’와 ‘셀린느’ 등을 입점시킨다. 이는 아직 더현대서울이 취약한 부분이다.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점은 MZ세대들이 명품 구매를 위해 많이 찾는 알짜 점포다. 이곳 루이비통은 전국 매출 1, 2위를 다툰다.
또, 최근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롤렉스도 입점해있다. 롤렉스 오픈런에 나서는 고객들이 많아 집객효과도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다. 기존 영등포상권에 없던 지미추·비비안웨스트우드·알렉산더왕 등 브랜드를 한곳에 모은 660평 규모의 해외패션 전문관도 운영 중이다.

롯데는 MZ세대를 겨냥한 젊은 백화점으로 이미지 메이킹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20~30대 직원에게 기획을 맡겨 백화점 1층에 맛집, 카페, 유명 편집매장을 들여 보다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더현대서울도 대비하고 있다. 더현대서울 역시 최근 백화점 매출의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해외 브랜드 입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떠오른 보테가베네타, 구찌, 발렌시아가 등의 입점을 마쳤다.
디올도 이르면 오는 7월 들어선다. 디올은 에·루·샤 못잖은 인지도로 매출은 전년 대비 76%, 영업이익은 137% 급증했다. 증권가는 올해 더현대서울의 매출을 8000억원 수준으로 내다본다. 여기에 디올 등의 브랜드가 가세하면 매출 1조 기록을 세우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세계그룹이 국제금융센터(IFC)몰 인수전에 뛰어들며 ‘건물주’를 노리는 것도 더현대서울을 견제하고, 영등포 상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최근 IFC몰 2차 본입찰에 참여했다. IFC몰의 몸값은 4조원이 넘어가지만, 강한 의지를 보인다. 인수 성공 시 ‘스타필드 여의도’를 선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럴 경우 영등포 상권은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빅딜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규모인 만큼 국내뿐 아니라 해외 대형 투자자 참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happy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