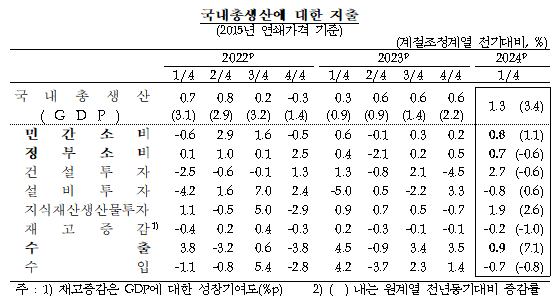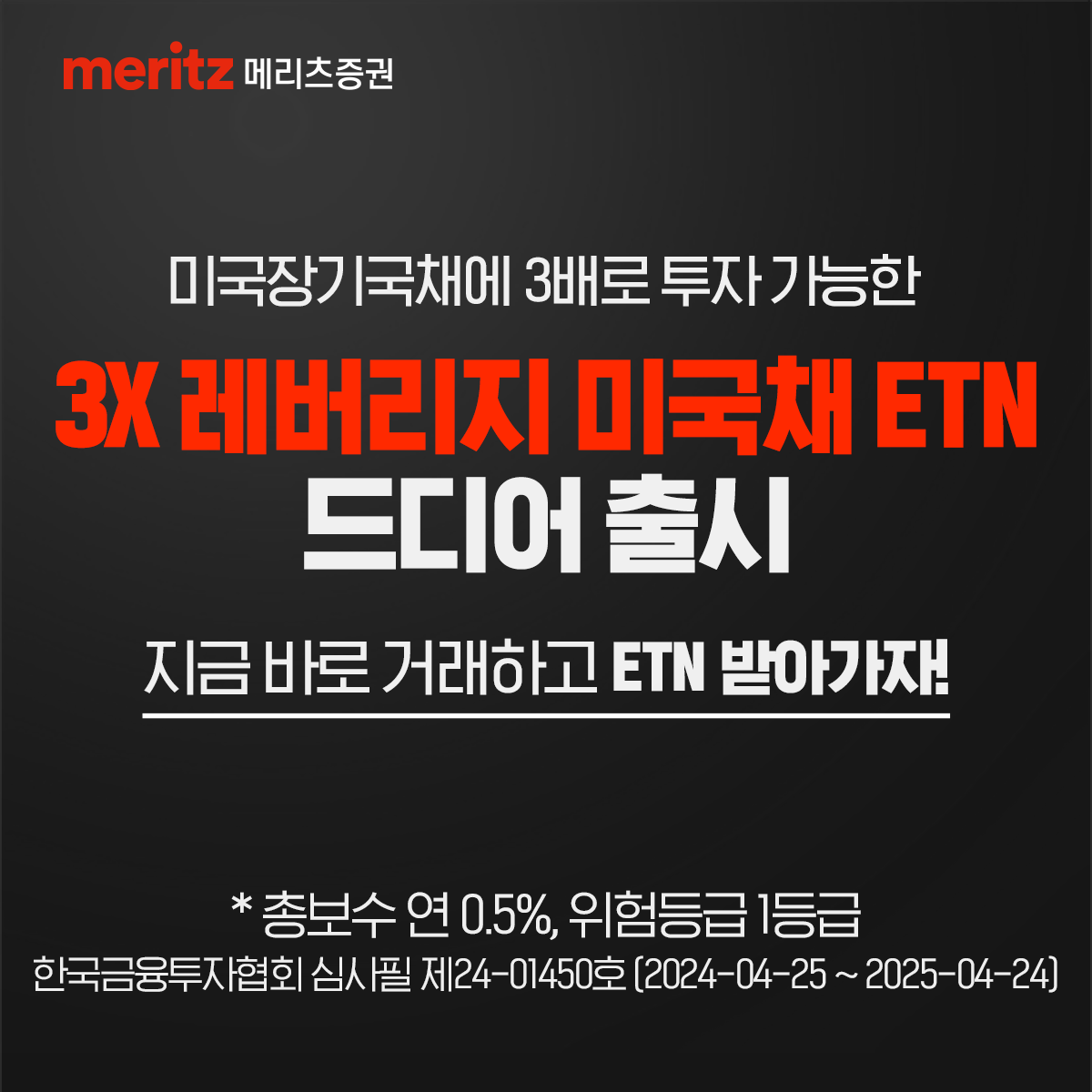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이하 ‘홍콩 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로 금융권 전체가 시끄럽다. 은행이 고객을 속여 가입시켰다거나 십수 차례 ELS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정말 투자위험을 몰랐겠느냐 등 설왕설래가 오간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소비자보호에 소홀했다는 데엔 이견이 없다. 불완전판매를 막을 만한 조처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홍콩 ELS는 지난해 말까지 39만6000계좌나 팔렸다. 판매금액만도 18조8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1∼2월 만기가 도래한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에 이른다. 홍콩 ELS 판매잔액은 KB국민은행이 8조원대로 가장 많고 신한·NH농협·하나은행이 2조원대, SC제일은행이 1조원 초반대다. 홍콩 H지수의 반등이 더딘 가운데 만기를 앞둔 홍콩 ELS의 손실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홍콩 ELS는 계좌 3개당 2개꼴로 은행에서 판매됐다. 은행들은 홍콩 ELS를 더욱 많이 팔도록 핵심성과지표(KPI)를 설계했다. 예·적금만 가입해온 보수적 성향의 금융소비자에게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ELS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등 극단적 수익 추구 행태를 보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력이 약한 고령투자자에게 상품 내용을 “이해했다”고 답변을 유도한 후 홍콩 ELS를 팔기도 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로서 원칙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조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과 증권사의 행태는 법 제정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중위험·중수익’. ELS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수식어다. 은행 예금 대비 수익률은 높은데 주식 투자보다 위험성은 낮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이 얼마나 그럴싸한 표현인가. 손실 리스크만 조금 감내하면 그만큼의 이익을 얻을 것 같은 인상을 주니까 말이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손실이 난 홍콩 ELS를 중수익·중위험 상품이라 규정해선 안 된다. ELS는 기초 자산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은행 예금보다 적게는 1~2%포인트, 많아도 한 자릿수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기초 자산이 손실 구간에 들어서면 상품 설계 방식에 따라 원금이 반 토막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은행과 증권사뿐만 아니라 ELS를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포장한 주체들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특히 언론은 ELS를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라 둔갑시키는 데 일조했다. ‘워치 독(감시견)’ 역할을 수행하기는커녕 투자자들을 위험에 내몰았다. 독자들의 자산관리에 도움을 주겠다면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과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를 거친 후, 금융당국은 2019년 말 ELS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정의했다. 그만큼 투자위험도가 큰 상품이란 얘기인데, 언론은 ELS를 일컬어 중위험·중수익이란 용어를 비판 없이 수용했다. 여전히 신문지상엔 “ELS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란 기사가 쏟아진다.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마케팅 용어를 아직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신문은 신규 상장 공모주를 언급하며 ‘따따상(상장 첫날 공모가의 4배 상승)’ 가능성을 주로 부각한다. 하지만 수요예측을 잘못한 기관에 대한 지적은 무디다. 최근 1년 새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한 새내기 공모주의 절반이 공모가를 밑도는데도 말이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도 유독 관대하다. 주택매매가격의 등락 폭이 작을 땐 ‘시장이 얼어붙었다’며 염려한다. 언론이 개별 투자자들의 수익률까지 보장해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신문기사를 읽고 금융 상품을 잘못 이해해 큰 손실을 봤다는 소비자들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