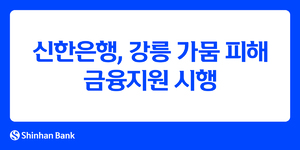|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원룸이나 빌라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군입대, 취직, 입사, 결혼, 타지역으로의 이사, 학업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자칫 전·월세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계약할 때 기간에 대해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전·월세 계약기간은 크게 1년 계약과 2년 계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입자의 경우 미래가 다소 불투명할 경우 1년 계약을 원하는 경우가, 임대인은 1년마다 지출해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2년계약 등을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1년 단위의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처음 계약했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오랜기간동안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례입니다.
그럼 최소 전·월세 임대기간은 몇 년 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거용건물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2년까지 간주됩니다.
따라서 만약 1년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후 1년 더 거주가 가능해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짧게 하기를 원하는 세입자의 경우 1년 계약 후 계속 거주를 원하면 계약갱신을 통해 1년 더 거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신 이 경우는 단점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경우 집주인은 새로운 계약을 통해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데요. 1년만에 임대료와 보증금이 인상되는 상황이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썩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했을 경우에도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는 경우인데요. 보통 군입대, 취직, 입사, 결혼, 타지역으로의 이사, 학업 등의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세입자가 중간에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향후 일정이 구체적인 경우라면 세부적인 월 단위까지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사전에 문의 후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