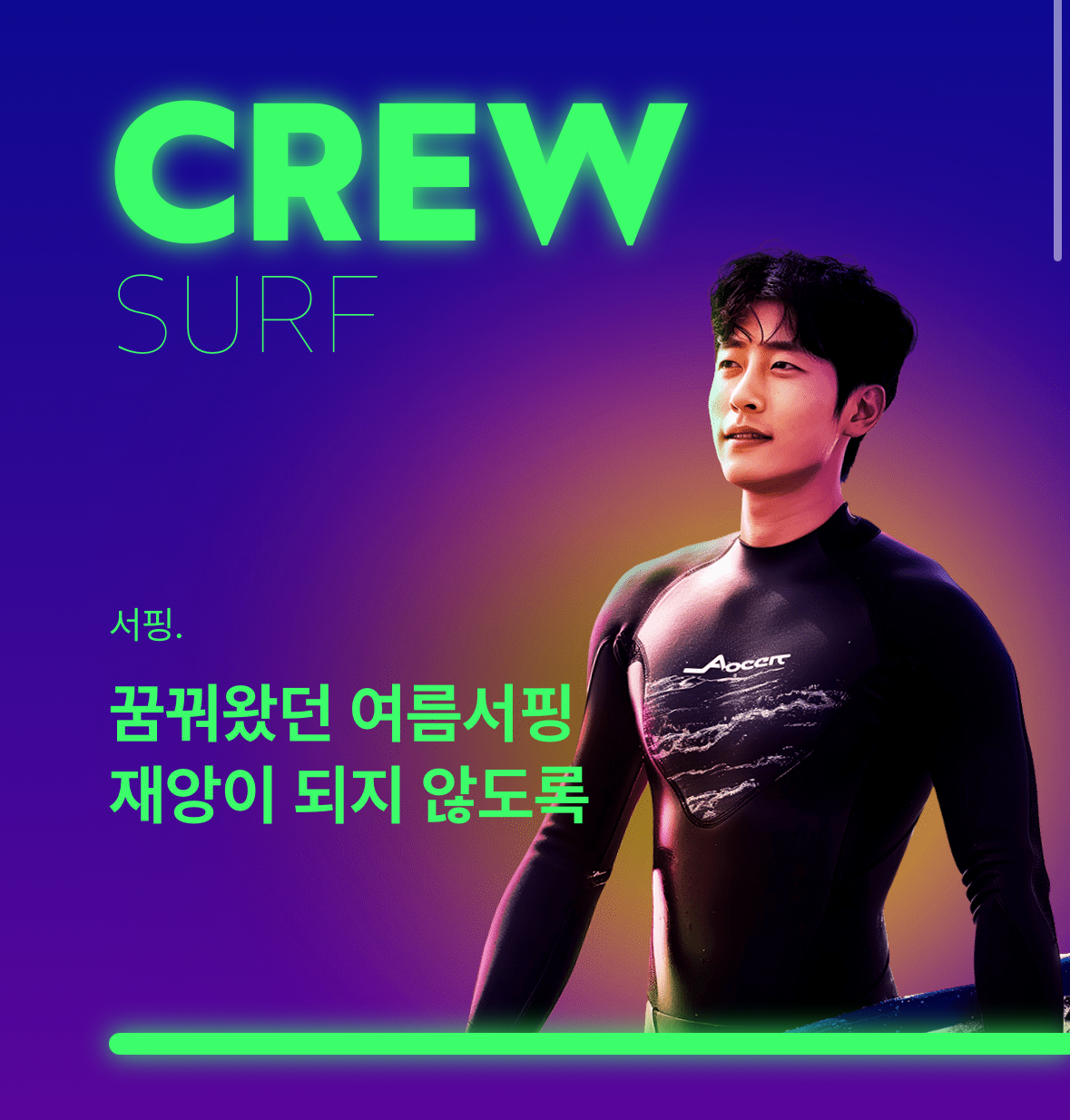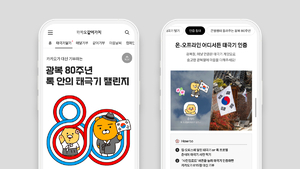NH농협은행의 국제화 수준이 주요 은행 대비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자산 및 총수익에서 해외부문은 차지하는 비중이 채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수준이다. 자산 규모가 훨씬 열위한 지방은행에도 뒤처질 정도다.
3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NH농협은행의 초국적화지수는 1.67%에 그친다. 국내 5대 은행 중 최하위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18.33%로 가장 높고 다음은 신한은행(15.33%), 하나은행(12.33%) 순이었다. 농협은행의 국제화 수준은 주요 은행과 비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초국적화지수는 기업의 국제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금감원이 2008년 도입했다. 해당기업의 해외자산·해외수익·해외직원수 비중 등 주요 지표를 산술평균해 구한다.
지난해 NH농협은행의 전체 자산에서 해외자산(원화환산 기준)이 차지하는 비중은 0.29%에 불과했다. 이 비중은 2019년 0.12%였는데 3년 새 별다른 개선세를 보이지 못했다.
반면 국내 경쟁은행들은 해외자산의 비중이 두 자릿수를 넘는다. 옛 외환은행의 노하우를 보유한 하나은행의 해외자산 비중이 10.91%로 가장 높았고, 베트남신한은행 등을 탄탄하게 키워나가고 있는 신한은행의 해외자산 비중은 10.89%를 기록했다. 24개국에서 네트워크를 가진 우리은행의 해외자산 비중은 10.74%로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뒤를 바짝 쫓았다. 상대적으로 해외 진출이 늦었던 KB국민은행의 해외자산 비중은 7.3%에 그쳤지만 2019년(3.0%)에 비해선 2.5배가량 확대됐다.
농협은행이 지난해 거둔 수익 중 해외수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0.31%에 머물렀다. 신한은행(7.37%), 우리은행(5.29%), 국민은행(4.69%), 하나은행(4.66%)의 해외수익 비중과 큰 격차를 보인다.
농협은행의 글로벌 실적은 지방은행에도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대구은행과 전북은행의 총수익 중 해외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36%, 4.48%로 농협은행(0.31%)을 크게 웃돌았다. 농협은행의 해외수익 비중은 부산은행(0.52%)과 광주은행(0.35%)보다도 낮았다. 해외 네트워크도 여전히 취약하다. 현재 농협은행의 해외 네트워크는 총 8개국에서 지점 5개, 법인 2개, 사무소 4개 등 총 11개에 그칠 뿐이다.
농협은행의 글로벌 성과가 부진한 건 주요 시중은행에 견줘 해외 진출 시기가 늦었던 측면이 적잖다. 2012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전까지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소속돼 있어 국외점포 설립 인가에 많은 제약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출범 이듬해인 2013년 8월 첫 해외 지점인 미국 뉴욕지점의 문을 열었고, 2016년에서야 아세안(ASEAN) 지역 내 첫 지점인 베트남 하노이지점을 개설했다.
농협은행은 향후 동남아시아 주요국 및 글로벌 금융허브거점 추가 진출을 통해 2025년까지 11개국 14개 이상의 점포를 확보한다는 각오다. 지난해 7월과 9월엔 중국 베이징 지점과 호주 시드니지점이 문을 열었고, 이달 중 인도 노이다지점 개설을 앞두고 있다. 농협은행 글로벌사업부문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의 핵심 목적인 은행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수익창출을 위해 영업기반 구축 및 IB기업여신 확대 등 핵심 강화를 통해 향후 5년 내 글로벌 부문에서 300억원 이상의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